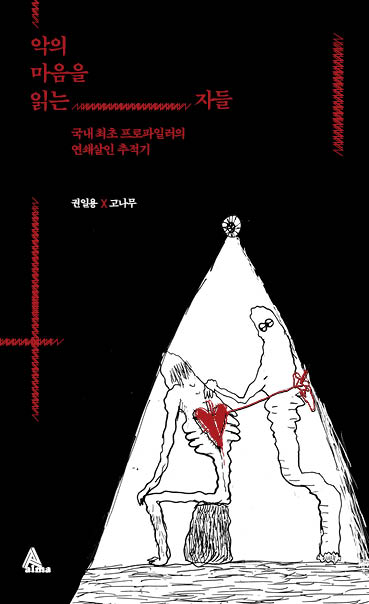
내가 좀 더 어렸을 때는 수사물이나 탐정물이 대 유행이었다. 소년탐정 김전일로 대표되는 만화는 물론 여러 가지 스핀오프 시리즈를 가진 CSI나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미국 드라마에 흠뻑 빠져 지내곤 했다. 이런 수사물, 탐정물을 보며 법의관이나 프로파일러를 꿈꿔보기도 했었다.
그런 나에게 이 책이 눈에 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프로파일링, 범죄심리에 대한 흥미는 오래전에 식었다 해도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고 마는 것이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읽는 내내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다. 아마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하나는 내가 세상에 지독하게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범죄 중 범인의 이름을 듣기 전에 사건과 사람의 이름을 연결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건 뿐이었다. 나머지는 범인의 실체를 작가가 알려주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 아마 이런 강력범죄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알아챌 법한 큰 사건이었는데도 도통 범인과 매치시키질 못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왜 이런 인간들이 생겨나는가 하는 궁금증이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서 그 원인이 속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다.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지독히 이기적인 인간들의 등장은 모두를 두렵게 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세 번째는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사형 제도 자체의 존폐와 사형 집행. 나는 스스로 진보주의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은 한없이 보수적이다. 사형제도는 필요하다고 믿는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사회에 다시 돌려보내서는 안 되는 괴물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이라는 제도가 사라지고 그들이 언젠가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가능성조차도 짓밟아주고 싶다.

집행에 대해서는 생각이 복잡해진다. 이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서도 나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치우친다. 이 시간에도 그들에게 쓰이고 있는 세금 1원조차 아깝다. 그리고 그들의 사형을 간절히 바랄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치적 이용의 가능성, 오심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프로파일러로서의 의무감, 힘겨움들을 풀어놓으면서 공감 갔던 것 중 하나가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 감정을 배제하고 사건을 팩트로 다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다. 범인에 대한 분노도 피해자에 대한 연민도 모두 삼켜내는 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을까.

나는 '반성'에 대한 감형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대체 그들에 제출하는 반성문이, 재판장에서 내뱉는 사과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피의자가 사과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미 없다면? 그 사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 피해자를 대신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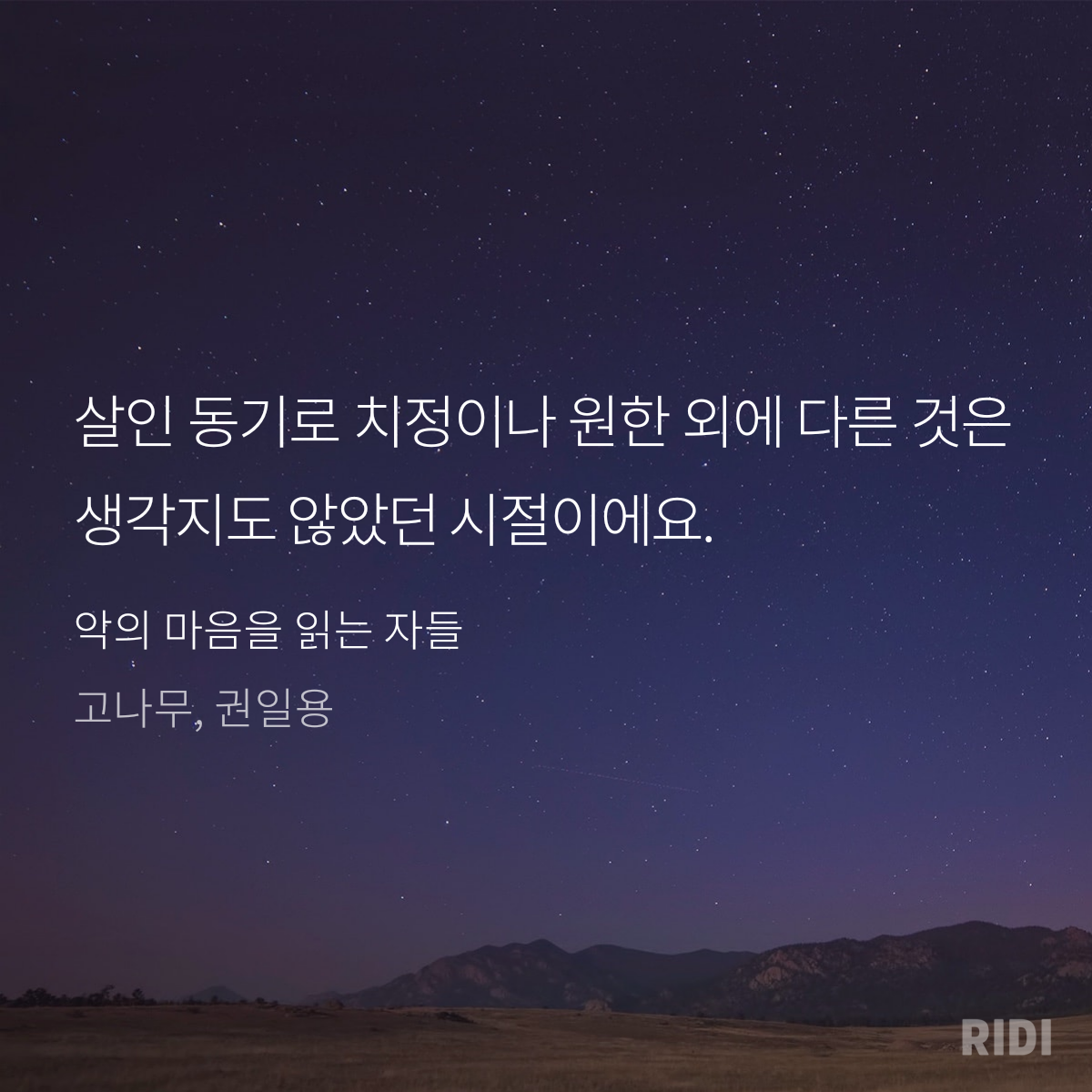

예전의 이야기다. 살인이 일어나면 금전, 애정, 원한 같은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알아들을 수는 있을 법한 원인이 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악으로 태어났든, 악으로 자라났든, 악인 인간이 있다. 이런 악의 범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누군가는 오늘도 무거운 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꼭 프로파일러가 아니라도 가족에게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 말이다. 아주 평범하고 퇴근 후 가족과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나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고독함을 가지고 있을 터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알게 되었지만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가 방영 중이라고 한다. 한번쯤 드라마를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 하려한다.
'책 읽는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가 부산한 이곳을 사랑해> 이슬기 (0) | 2022.03.20 |
|---|---|
| <생각하고 싶어서 떠난 핀란드 여행> 마스다 미리 (3) | 2022.03.15 |
| <세상 어딘가에 하나쯤> 유희경 (0) | 2022.02.15 |
| <아내 대신 엄마가 되었습니다> 후지타 사유리 (0) | 2022.02.11 |
| <나는 네Nez입니다> 김태형 (0) | 2022.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