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한 서점'에서 구매한 <교토의 밤 산책자>. 이 작가님 책을 좋아하냐는 우연한 서점 사장님 질문에 나는 처음이라고 답했다. 사실은 모르겠다. 어떤 책을 읽든 작가님 이름은 도무지 외워지지 않아서 작가님을 보고 고른 책이 아니라면 작가님 이름을 기억해본 적이 없다.
[일상이야기] - [부산 광안리] 내 나이의 책을 만나고 싶다면, 북카페 - 우연한 서점
[부산 광안리] 내 나이의 책을 만나고 싶다면, 북카페 - 우연한 서점
요즘 뽈뽈거리며 돌아다니는 일이 늘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생긴 일이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저 가보고 싶다는 생각만 했을 곳들을 요즘은 용기 내어 방문해보고 있다. 아주 좋은 일이다.
puddingluna.tistory.com
여행을 많이 하신다는 이다혜 작가님의 책을 고른 것은 '교토', 그리고 '산책' 때문에. 별로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나도 교토를 산책해본 적에 있다. 한여름 찌는 듯한 날씨의 교토는 그다지 산책하기 좋은 도시는 아니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리스트에 들어있다. 꽤 유명한 철학의 길을 걸었는데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볼 것도 별로 없었고 날씨는 더운 데다 날벌레가 너무 많아서 고생했었다.
하지만 교토 자체는 좋아하는 편이다. 역사가 깊고 볼 것도 많은, 그리고 여행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여행의 힘듦이나 좋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 여행했던 도시들에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해당 나라나 도시에 호감이 있다는 뜻 아닐까?
나는 3일을 온전히 교토에 머물렀는데 너무 욕심내서 이곳저곳을 방문하다보니 오히려 내가 뭘 봤는지 헷갈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여행을 하다 보면 성당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 거기가 거기 같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다 비슷하게만 느껴졌다. 지금은 내가 어딜 가봤는지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너무나 아쉬운 여행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책 <교토의 밤 산책자>의 부제는 '나만 알고 싶은 이 비밀한 장소들'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장소 한둘쯤은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느꼈던 감동이나 여유로움, 혹은 어떤 종류의 좋은 감정을 나만 오롯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물론 내가 간 곳들은 대부분 유명 관광지라 운 좋게 여유로움을 느낄 정도로 한산한 시간에 방문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곳은 나만 아는 곳이 아니지만.
그런데 우습게도 다른 책이나 인터넷 같은 곳에서 그곳을 발견하면 더없이 반가운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장소들을 책으로 공유했으니 이 두가지의 역설적인 감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말이 나온 김에 나도 내가 간직하고 있는 비밀 장소를 한군데 공유하고 싶은데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근처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 마르 성당'이다. 까떼드랄(대성당)처럼 규모가 크거나 볼거리가 많은 곳은 아니다. 큰길에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는 자그마한 성당인데 그 분위기나 고즈넉함이 반할만하다.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햇살, 조용한 실내의 공기, 성스러운 분위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에 드는 곳이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마침 누군가 오르간을 연주했는데 성당 내를 가득 채우는 그 소리까지 더해져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물론 바르셀로나 최고의 성당으로는 단연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꼽지만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는 빠지지 않는 성당이다.

내가 교토를 여행했을 때는 6월 말쯤으로 아직 한여름은 아니었는데, 한창 여행시즌은 아니었는지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 많았다. 마룻바닥을 밟으며 길게 이어진 복도를 혼자 걸을 때는 나도 모르게 말도 안되는 상상 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상상력으로 따지면 부족한 편에 드는 사람인데도 그럴 정도였으니 말 그대로 그 분위기에 '홀렸'었는지도 모른다.

사람이 별로 없었던 곳 중 하나는 무린안이다. 무척이나 지쳤고 더위를 먹은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 여행 가이드북에서 보았던 무린안에 들른 것은 반쯤은 변덕 때문이었다. 원래 다른 곳에 가려고 했지만 너무 지쳤기 때문에 당장 쉴 곳이 필요했는데 마침 무린안이 근처에 있었다.
요금을 내고 안으로 들어서자 길 위에서 더위에 지칠대로 지친 나에게 안도와 휴식이 밀려왔다. 자그마한 그 정원 속 개울의 물 흐르는 소리, 풀소리, 온통 녹색으로 물들었던 풍경 속에서 나는 앉지 않고도 쉴 수 있었다. 그 안에 정말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반대로 모든 것이 내 것인 순간이었다. 나 혼자 누린 그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은 무린안을 어떤 관광지보다도 더 기억에 남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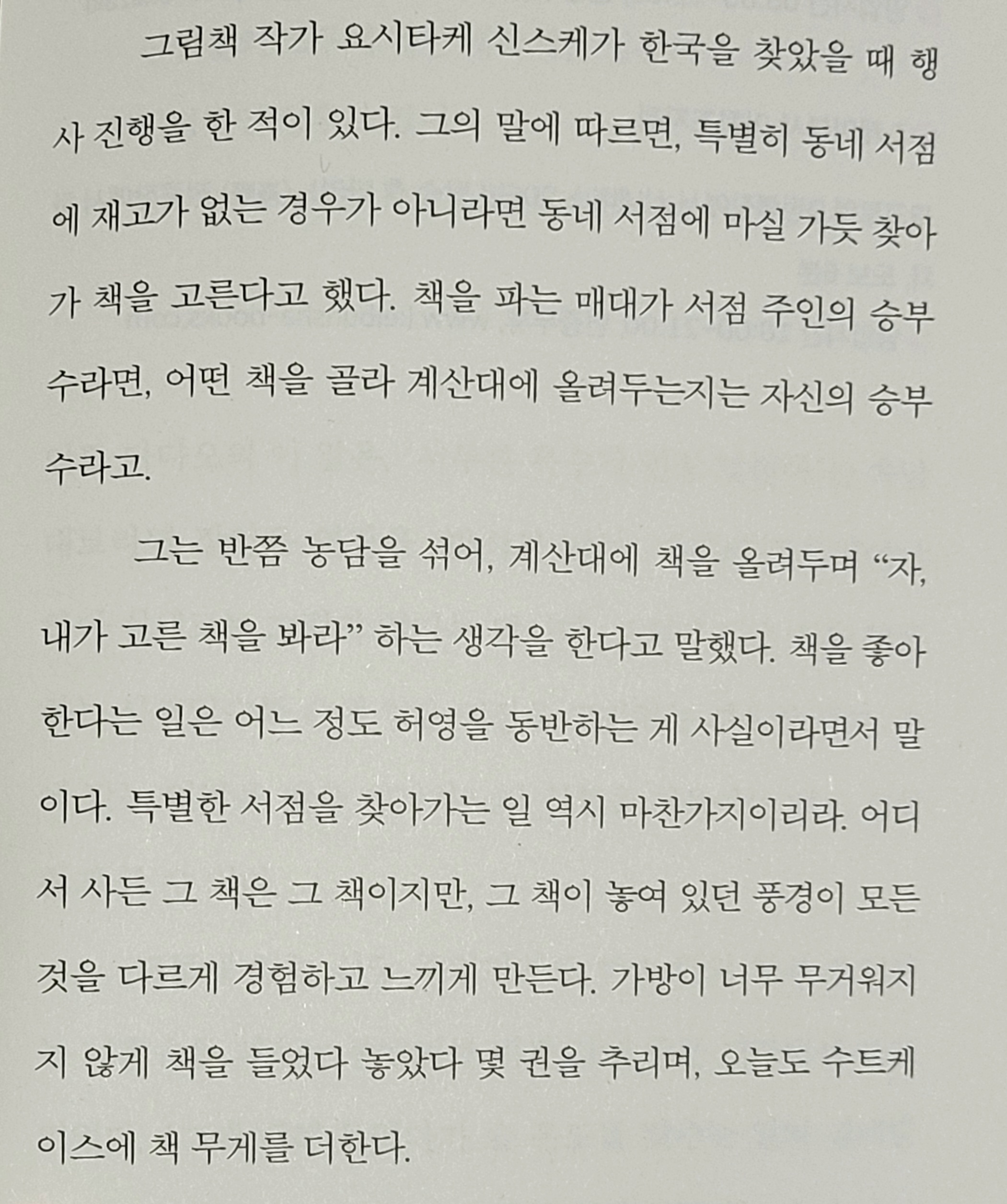
나는 책을 즐겨읽지도, 많이 읽지도 않는 사람이라 허영심을 부릴 정도는 못되지만 '그 책이 놓여 있던 풍경이 모든 것을 다르게 경험하고 느끼게 만든다.'는 문장에 매우 동감했다. 똑같은 책이라도 만나는 때와 장소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유독 손이 가거나 눈에 띄는 책이 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만나더라도 사게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에 그곳에서 만나는 것, 그게 운명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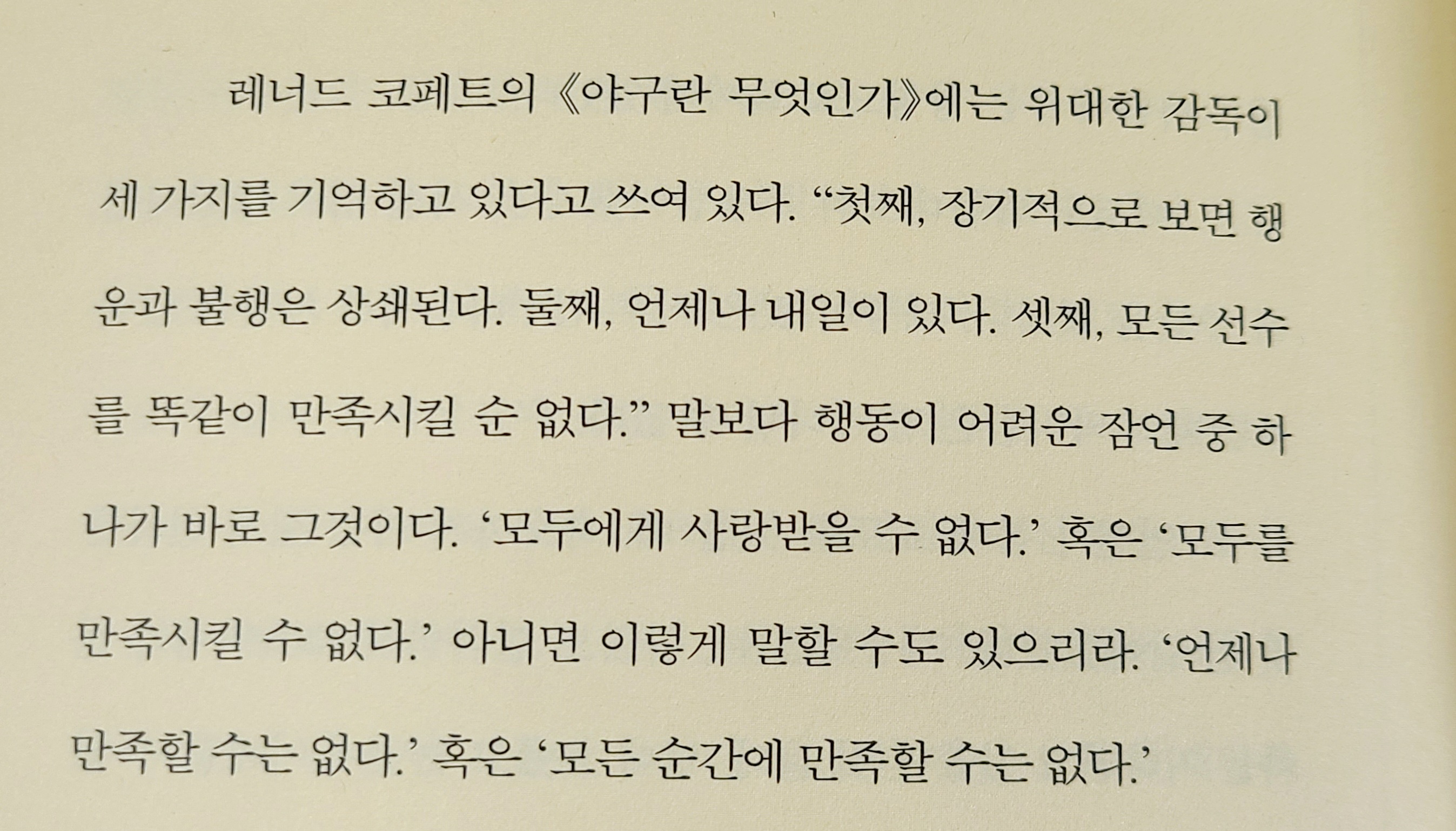
모두를 똑같이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여행, 여행지도 마찬가지다. 여행 가이드북,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추천글을 보고 가더라도 막상 가보면 실망하게되는 일이 허다하다. 이유는 제각각이어서 무언가 하나를 콕 집을 순 없지만 다른 사람 모두를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누구나 사랑하는 유명 여행지에 가서 시큰둥해 본 경험은 누구나 있지 않을까? 나는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갔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는데 오히려 이름도 없는 오렌지 나무가 가득한 정원에는 홀딱 반하기도 했다. 사람이란 실망하는 기준도 만족하는 기준도 제각각이다. 그걸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 한 일일 것이다.
이런 책을 읽을 때면 생각하는것이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알지?' 싶은 부분이 있다. 예로 든 고전의 문장, 또는 오래된 가게의 역사 같은 것들 말이다. 호기심도 별로 없고 말수도 적은 나는 가게의 작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설마 다 물어보는 건 아니겠지?
이 책은 정보와 감상이 버무려진 글이다. 진지함과 유쾌함이 공존해서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오기도 한다. 교토를 여행하기 전 자료조사 겸 읽어도 좋고, 혹은 나처럼 교토를 여행했던 사람이라면 추억을 떠올리며 좋을 책이다.(물론 여행과 무관하게 읽을 수도 있다.) 즐겁게 책을 읽다 보면 막연히 교토로 마음이 향하는 마법 같은 경험은 덤인 셈이다.
'책 읽는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책 좋아하세요?> 김혜림 (0) | 2022.04.08 |
|---|---|
| <아직, 도쿄> 임진아 (0) | 2022.04.04 |
| <우리가 부산한 이곳을 사랑해> 이슬기 (0) | 2022.03.20 |
| <생각하고 싶어서 떠난 핀란드 여행> 마스다 미리 (3) | 2022.03.15 |
|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고나무, 권일용 (0) | 2022.02.27 |



